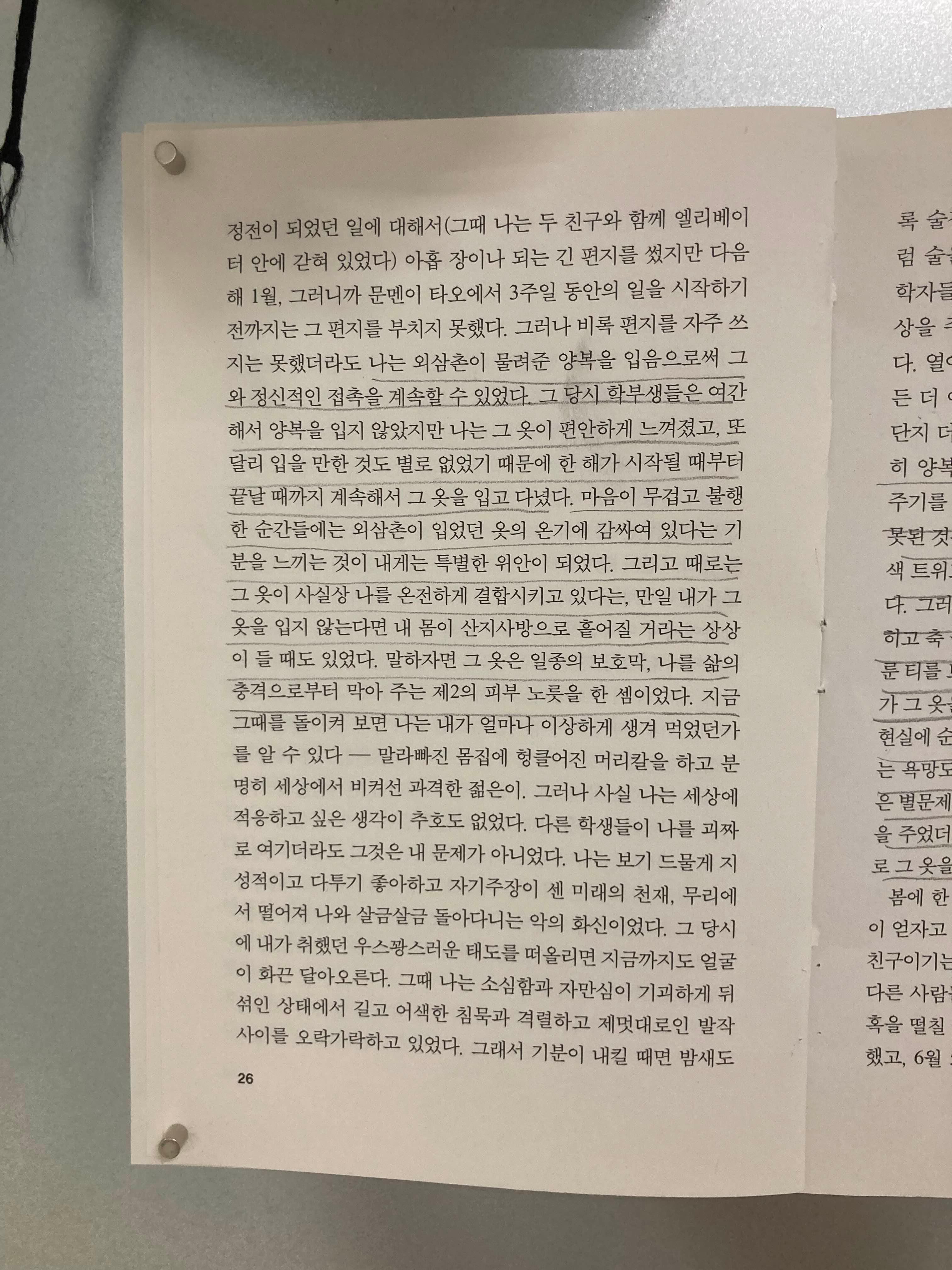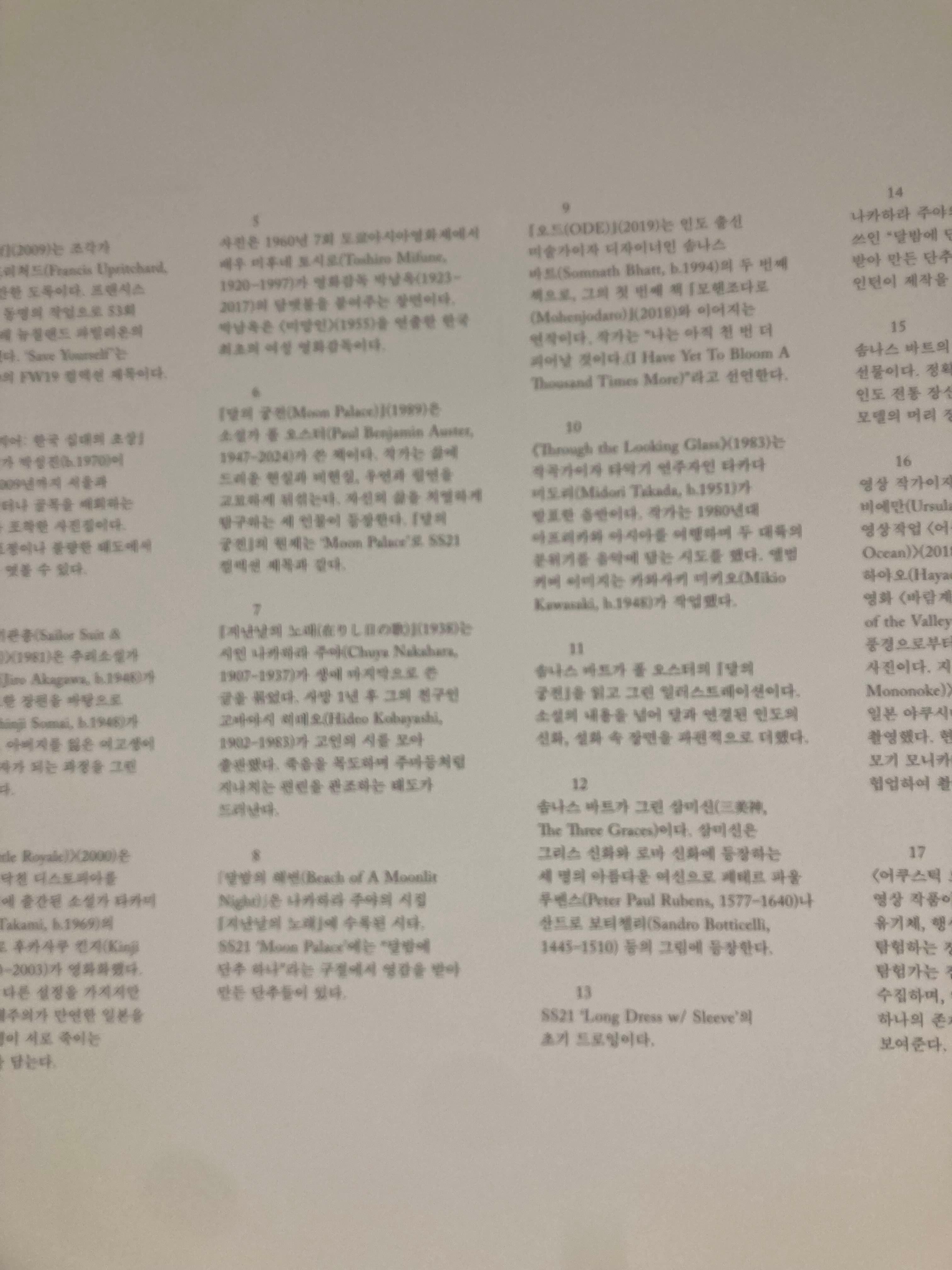6월은 전시의 달 ✩
✩ 신난다. 내가 사랑하는 일민미술관에서.
시대복장은 오늘날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세 스튜디오를 ‘미술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소개하며 현대에서 바라보는 예술이라는 장르에 대해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모든 창작을 예술이라는 범위 안에 바라보지만 이상하게 패션은 나와 거리가 항상 멀어 보였다. 옷을 많이 좋아하지만, 쉽게 입고 바라보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과 복잡하게 조합하고 해체하여 만드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진작에 느꼈던 탓이다. 패션 디자인의 세계는 디자인이라고 칭하는 다른 장르보다도 실용성보다는 예술성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심오한 퍼포먼스의 영역인거 같아 보이기에, 세계 유명하다는 패션쇼를 여는 일명 하이브랜드는 나같은 서민의 공감을 얻기는 무릇 어려워보였다.
다른 미술관과 다르게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전시장을 돌아 다니고 있었다. 패션을 전공하는 듯한 이들은 옷 하나하나를 눈으로 해체해보며 분석하고 있었지만 뭐 나는 그냥 보고 느끼는대로, 일차원적으로 전시를 감상할 뿐이었다. 물론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3개의 브랜드는 워낙 유명해서 이름정도 알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패션 브랜드가 전시의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전시를 보기는 힘들어서 궁금증이 커졌던 것도 있었다.
일단 파프는 나에게는 패션 브랜드보다는 넘어 퍼포먼스 집단 같은 느낌이었다. 오래전부터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브랜드를 알려오기도 했고 과정을 담은 영상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옷에 형태도 눈에 띄었지만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함께 만들어낸 브랜드인만큼 ‘옷을 어떻게 만들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식과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보일까도 고민하는 집단 같았다. 역시나 보통 마네킹이나 옷걸이에 옷을 걸치는 기존에 '옷을 보여주는 방식'과 다르게 연출 방식이 독특했다. 그래서 옷보다는 옷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더 눈길이 갔던 것은 사실이다. 옷 무게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는 낚시대 형식에 옷걸이, 패턴의 조형을 통해 공간에 스며들게 했던 재미, 그리고 불편하게 봐야하는 영상까지… 영상으로만 봐오던 그들의 스타일을 직접 마주하게 되어 재밌는 감각적 관람이었다.
혜인서는 사실 가장 나의 취향과 근접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가장 작업과정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는데, 난 원래 그런 전시를 더 흥미로워하는 편이다. 그래서 더 인상이 깊었나. 사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옷이라는 작품만 봤을 때는 쿨한 느낌이랄까. 현대적인 느낌이었는데 작업과정을 보니 굉-장히 디테일이 엄청난 디자이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자신의 머릿 속에 있는 상상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사소한 장신구에도 의미가 깃들어 있는 디테일. 충분히 매료되었다.
패션 전시라고 해서 옷을 입힌 마네킹들의 나열이라던지 화려한 조명이 있는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분명하고 미니멀하게 보여줘서 좋았고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다.(이전에 현대 리스타일 전시 볼 때 뭐가 너무 많고 눈이 아팠음)